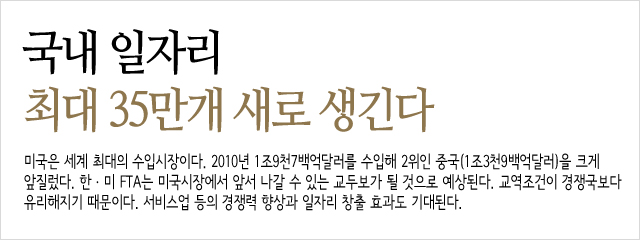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처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 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7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며칠 전인 12월 3일에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 타결하자 나온 기사였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잖아도 한국 기업의 발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교역 조건마저 한국에 유리해지면 일본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 우려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인 파급력을 경쟁국인 일본이 인정한 셈이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기업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고용이 느는 효과가 기대된다.

![]()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편익을 바라볼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미국 제품들이 들어와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소비자후생이 커진다는 얘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들이 지난해 8월 공동 발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5.66퍼센트, 단기적으로는 0.02퍼센트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기적인 GDP 증대는 0.48퍼센트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다. 후생도 마찬가지다. 최선의 경우 3백21억달러 향상되지만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25억5천만달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효과 역시 FTA 발효 후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고용은 4천3백명가량 증가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약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다. 고용창출은 특히 서비스업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 약 27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
교역량과 무역흑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미 수출은 발효 후 15년 동안 연평균 12억9천만달러, 수입은 11억5천만 달러 늘어나 1억4천만달러가량 흑자가 확대된다. 제조업은 연평균 5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4억3천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확대도 바라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10개 국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장벽이 사라지면서 대 세계 수출이 연평균 31억7천만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입 증가액은 1억4천만달러에 그쳐 무역흑자가 약 30억3천만달러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일반기계 등의 약진이 기대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대되면서 자동차의 무역흑자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1억3천만달러, 전기전자는 8억5천만달러, 화학은 2억9천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일반기계 등의 약진이 기대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대되면서 자동차의 무역흑자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1억3천만달러, 전기전자는 8억5천만달러, 화학은 2억9천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산유발효과도 크다. 발효 후 15년간 자동차가 연평균 2조9천억원, 전기전자 2조원, 화학이 9천억원 정도 생산이 증대된다.
농업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천1백50억원이다. 특히 축산업의 위축이 걱정이다. 연평균 4천8백66억원이나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수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미 수출액이 연평균 78만달러가량 늘어나지만 수입증가액은 1천1백78만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명태 생산국이어서 관련 원양어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원양어업은 연평균 1백54억원가량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희비가 엇갈린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국산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쿼터가 각각 5퍼센트포인트 감소하게 돼 연평균 51억9천만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은 생산과 소득이 모두 증가한다.
외국인 지분투자를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통신서비스 역시 외국인 진입이 확대돼 생산은 연평균 7백10억원, 소득은 3백10억원 확대된다.
글·변형주 기자
※ 출처 : 위클리공감(2011.10.13 제130호)
'블루마블 문헌보관소 > 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웹툰]'한-미 FTA 괴담' 진실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5) | 2011.11.15 |
|---|---|
| 한-미 FTA, 오해와 진실 (1) | 2011.11.12 |
| [카툰 공감] FTA를 막아라!? (1) | 2011.11.07 |
| 한-미 FTA 경제효과, 진실은 무엇일까? (3) | 2011.11.02 |
| [한-미 FTA]"FTA는 위험 낮추고 위기 넘는 발판" (0) | 2011.10.24 |